할머니는 해녀였다. 상군 해녀였다.
어머니도 해녀였다. 스물일곱 청상(靑孀)의 어머니는 물질로 세 남매를 키웠다.
아흔 네 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숨 막히는 ‘삶의 물질’이었다.
해녀 할머니의 손자이자 해녀의 아들은 그들의 ‘숨비소리’를 들으며 삶의 8~9할을 엮어냈다.
‘숨비소리’는 제주말(語)이다.
해녀들이 숨을 참고 바다 속에서 작업을 하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해 바다위로 솟구쳐 올라 뿜어내는 숨소리다.
폐부 속 깊숙이 참고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비워내는 소리다.
숨을 비워내는 ‘숨비소리’는 거친 파도와 싸우며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며 삶을 개척했던 해녀의 상징이다.
힘들고 고단했던 삶의 궤적이며 아직도 풀어내지 못한 절절한 역사의 응어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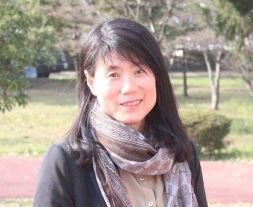
그러기에 허영선 시인의 시집 ‘해녀들’을 받아들고는 한 동안 가슴이 먹먹해질 수밖에 없었다
눈물로 쓴 해녀 할머니, 해녀 어머니, 해녀 삼촌들의 편지를 보는 듯 무디었던 감성을 긁어냈기 때문이었다.
시로 쓴 ‘해녀열전’은 엄혹한 시대를 살았던 우리들의 할머니, 어머니, 삼촌들의 살 떨리는 삶의 이야기였다.
여인들의 처절한 삶의 투쟁기록이며 슬프지만 강인했던 제주여인들의 역사기록이었다.
고통과 인내와 사랑과 희생을 하나로 녹여낸 제주여인의 서사시나 다름없었다.
시인은 “현대사의 악다문 고통, 제주4.3의 동굴 속에서 남편 잃고 살 아 남은 여인은 가장으로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그렇게 오로지 혈육의 입을 위해 물에 들어야 했던 그들의 이름이 어디 한 둘이랴.
먼 바다까지 나가 파도처럼 출렁이며 삶을 건져 올렸던 그들, 물속의 그들을 물 밖으로 불러내고 싶었다“고 했다.

시집을 엮었던 동기였다.
시인은 울고 있었다. 떠나간 해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이름을 바다로 흘려보내며 속으로 울고 있었다.
‘해녀들’은 시집이라기보다 눈물로 쓴 여인들의 ‘수난의 역사 수첩’이었다.
눈물로 현대사의 비극을 써 내려간 제주시인 허영선,
문학평론가 임헌영은 허영선을 ‘섬에서 울고 있는 푸른 별을 닮은 시인’이라고 했었다.
“현무암처럼 견고한 눈물로 쓴 시, 세월이 흘러도 그칠 줄 모르는 설움의 시원(始原)은 한라산의 산 뿌리에 자리해서 섬사람들의 원한의 갈증을 축여주는 눈물샘”이라고 했었다.
‘4.3의 여인들’을 다룬 시인의 두 번 째 시집 ‘뿌리의 노래’가 나왔을 때 였다.
시집 ‘해녀들’도 마찬가지다. 한 많은 해녀들의 슬픈 노래다. 슬픈 해녀들에게 바치는 헌시(獻詩)였다.
고통과 아픔을 쟁여온 해녀들을 향해 울음 참으며 가슴으로 썼던 시다. 눈물샘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한국의 큰 시인 고은도 ‘읽고 읽고 또 읽으며 울음이 저 캄캄한 물속의 울음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시집 ‘해녀들’ 추천의 글을 통해서다.
가감 없이 여기에 옮기면 이렇다.
‘시가 죽다니,
시가 죽어질 수 없는 엄중한 사실로 여기에 이 시집이 있다.
읽었다.
읽었다.
또 읽었다.
가슴 복받치며 읽고 나니 저 불란서 시가 건달로 보였다.
서울의 수많은 에고 시편들도 내 시도 유죄였다.
꽃이 피의 꽃이라는 것.
울음이 저 캄캄한 물속의 울음이라는 것.
이제야 재주도의 육친 같은 진실이 제대로 솟아났다.
이제야 제주도의 삶으로부터 제주도의 시가
세상의 형식위로 솟아올랐다.‘
큰 시인이 보내는 대단한 찬사였다.
초기 허영선 시(첫 시집 추억처럼 나의 자유는.1983)를 모더니즘시로 분류하는 쪽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두 번째 시집 ‘뿌리의 노래(2004)와 최근의 ’해녀들‘은 리얼리즘 영역으로 읽혀진다.
경직된 이념의 사슬에 얽매지 않는 생생한 현실과 기억의 접점을 찾아나서는 치열한 현장의 장인의식은 민중지향적인 리얼리즘 시로 분류할 수도 있을 터이다.
시인의 사실주의 시풍에 대해 “20여년의 기자생활을 통해 체득한 현대사의 비극적 아픔이 그의 사실주의적 감성을 자극했을 것”이라는 추축은 가능하다.
문학사조나 경향에 관계없이 ‘해녀들’은 새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스스럼없이 거친 바다에 몸을 던지는 제주해녀들의 고통과 인내와 사랑과 희생 이야기다.
시인도 말했다.
‘사랑의 깊이 없이 어떻게 깊은 바다에 들겠는가.
사랑을 품지 않고 어찌 물에 가겠는가.
어떤 절박함이 없이 어찌 극한을 견디겠는가‘.
제주해녀들이 바다를 떠나지 못했던 연유가 ‘사랑 때문‘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해녀의 자식사랑은 펠리컨(사다새)의 모성을 닮았다.
펠리컨은 새끼들이 굶었을 때 자신의 가슴 털을 뜯고 살을 찢어 새끼들을 먹인다고 한다.
새끼가 병약하여 사경을 헤맬 때는 가슴살을 찢는 정도가 아니라 핏줄을 끊어 흐르는 피를 새끼 입에 넣어 준다.
그렇게 새끼를 살리고 자신은 조용히 눈을 감는다고 했다.
시인은 어쩌면 숨을 참아 고통을 견뎌내며 쉴 새 없이 물밑 작업을 하는 제주해녀들의 사랑과 펠리컨의 모성애를 같은 반열에서 생각했었을 수도 있다.
‘제주해녀’는 2016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됐다.
허영선의 ‘해녀들’이 잃어버리고 잊어버릴 뻔 했던 제주해녀들의 대서사시적 삶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마중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제주여인들의 절절한 삶의 궤적에 천착해온 시인의 시 작업이 고은 시인의 말처럼 ‘제주도의 시가 세상의 형식위로 솟아오르고 있음’이다'.
